뉴스레터 구독하기
장애인예술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해드립니다.
2024-04-04
E美지 31호/문학
더 괜찮은 작가가 되고 싶은 정상미
연극인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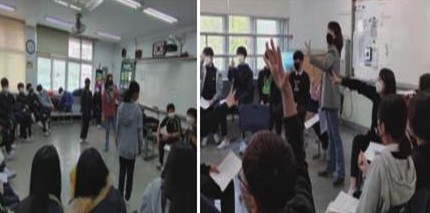
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전공했던 정상미 그녀는 학업보다 연극동아리 활동에 더 집중하며 연극에 푹 빠져 뜨거운 4년을 보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지적과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걸음걸이가 좀…”,“웃을 때 왜 눈은 안 웃고 입만 웃어?”반복되는 지적에 비로소 자신의 몸이 남과 다름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병원, 한의원, 자연치료 등 안 해본 치료가 없었지만 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다. 움직임이 하나둘씩 안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다가 2006년 신촌세브란스 신경과에서 근육병 진단을 받았다.
장애인이 된 후
마침내 중증 지체장애인이 되었고 그녀가 살아왔던 세상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몸이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더 이상‘연극배우’의 꿈을 꿀 수 없게 됐다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졌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현실에서 일단 벗어나고 싶어 동생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건너갔다. 어학연수를 가장한 현실도피였다. 대학 부속 일본어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하며 대학의 연극 강의를 수강하였다.
본과 1년을 마치고 2년 간의 연수과에 진급하게 되면서 일본 연극 현장의 한가운데서 연극을 제대로 배우며 작·연출로 공연을 올리게 되었다. 극단 내 최초 한국인 이름이 등장하는 ‘한국작품 번역극’공연이자 연수생 공연으로는 드물게 만석에 재관람 관객까지 생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희곡작가로 등단

201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그들의 약속’이 당선됐다. 그녀는 희곡을 쓸 때 신이 난다. 캐릭터가 대사로 생생히 살아나는 매력 때문이다. 극 중 인물이 활자에 머물지 않고 대사와 지문으로 생생하게 부활하기 때문이다. 힘든 자료조사와 플롯을 세워 마침내 첫 대사를 쓸 때 자기도 모르게 톡 튀어나온 언어 구슬이 줄줄이 꿰어져 가는 글쓰기가 즐겁다.
더 괜찮은 작가가 되고 싶다
희곡을 완성해도 무대에서 공연되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대본이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선정되어도 중간에 엎어지는 일이 허다했다. 간혹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서 원고료를 받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대사를 작가 의도와 맞지 않게 바꾸려는 관계자들과의 갈등은 항상 넘어야 할 험준한 산과도 같다.
하지만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루어내는 공연 한 편에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극장 안에서 울고 웃으며 대답하기 힘든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관객들을 보며 가슴 뜨거운 희열과 보람을 느낀다. 그녀가 힘든 가운데서도 끝내 연극을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인극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

그녀는 자신에게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근육병 장애는 남들보다 다소 일찍 찾아온 노화라고 생각한다. 늙지 앟는 사람이 없고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녀는 먼저 경험하고 있는 노인의 몸으로 현대인의 삶을 희곡으로 옮긴‘노인극’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